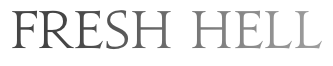[Review] 영화적 체험의 진수, 1917(2019)
movies 2020. 2. 4. 21:18 |시사회를 통해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프론트 러너로 활약중인 '1917'을 감상하고 왔습니다. '1917'은 적진을 가로질러 1,600명 아군의 목숨이 달린 편지를 전달하는데 투입된 두 병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동안 FPS게임을 하는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진행되는 영화는 아니지만, 카메라가 러닝타임 내내 롱테이크로 주인공을 잡고있기 때문에 제한된 관객의 시야가 관객들로 하여금 게임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유사체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간단명료한 스토리까지 겹쳐져 장군의 편지를 전달한다는 임무가 주인공 뿐만 아니라 주인공에게 동화된 관객들의 목표가 된다는 점 역시 엔딩을 목표로 게임을 하는 것만 같은 인상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게임적인 체험(또는 몰입)이 주인공과 동화된 관객들로 하여금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게 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는 측면에서 '1917'이 가진 게임과의 유사성은 단순한 기믹 이상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17'에서의 '체험'은 액션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아니라 쉬어가는 구간처럼 보이는 작은 장면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널부러진 과일나무들 사이를 거닐며 휘날리는 꽃잎이 손에 닿는 그런 소소한 장면 역시 주인공과 함께 느낌으로써 영화는 관객들에게 전장에서 피어나는 일상에 대한 향수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그러한 작은 장면들이 모여서 액션씬들에 무게감을 더하고, 더 나아가 영화의 주제적 측면에도 기여합니다. '1917'은 내내 휘몰아치는 태풍으로 관객들을 몰아세우고 압도하기 보다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이따금씩 비를 피하게 해주면서 관객이 맑은 날씨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에 가깝습니다.
물론 제작진은 '체험'에 방점을 두고 영화를 기획한 것이겠지만, 의도든 아니든 요즘 관객들에게 생소한 1차 세계대전이란 소재나 이제는 슈퍼히어로물로 대체되어버린 전쟁장르의 현상태를 고려할 때 '1917'이 제공하는 게임적인 체험은 게임이나 VR에 익숙한 신세대 관객들과 영화간의 거리감을 줄여주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래식 전쟁물이 가진 우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 시대에 걸맞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1917'은 구세대와 신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2010년대의 대표 전쟁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의 뛰어난 완성도와 별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역대급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현시점에 국내에 공개된다는 점이 무척 아쉬울 따름입니다.
'movi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Review] 인비저블 맨(The Invisible Man, 2020) (0) | 2020.02.26 |
|---|---|
| [Opinion] 버즈 오브 프레이의 액션에 대한 두 가지 불만(Birds of Prey, 2020) (0) | 2020.02.07 |
| [Interview] 제임스 윌비의 모리스(1987) 인터뷰 (0) | 2019.11.08 |
| [Review] 부활의 기회를 또다시 놓치다,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Terminator: Dark Fate, 2019) (0) | 2019.10.31 |
| [Opinion] 마틴 스콜세지의 마블영화 비판에 관해... (0) | 2019.10.17 |